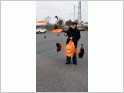매출 상위권을 유지 중인 회사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넥슨과 엔씨, 433, 소니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전병헌 의원이 '지스타 위기, 변화'를 언급한 것도, 최관호 지스타 조직위원장이 '게임대상 수상업체가 내년 지스타 메인스폰을 맡는 전통을 마련하자'고 한 것도 넷마블을 대표로 큰 업체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업계 종사자들도 '매출이 높은 회사는 지스타에 참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요 아닌 강요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지스타 참석여부는 회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스타에 참가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각 회사마다 이 비용집행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어떤 회사는 신작을 소개하기 위해, 다른 회사는 게이머들에게 대한 보답의 의미로, 또 다른 회사는 게임축제의 연장선에서 참가를 했을 것이다. 참가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회사 등을 떠밀어 참가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스타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게임협회)가 주최한 것이 올해로 3년째다. 민간주도로 열리는 게임행사에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다. 물론 관이 주도해 온 지난 행사에서는 눈치가 보여 참가하는 업체는 있었지만, 자율과 민간주도로의 전환이 대세인 지금에 와서 다시 관이 주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한 게임대상과 지스타는 별개의 행사다. 과거에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 열렸던 게임대상이 지스타가 부산에서 개최된 2008년부터 업체들의 편의성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전야제처럼 열리고 있다. 영화 시상식이 대종상, 청룡상 등이 있는 것처럼 게임대상도 언론사가 주최하는 하나의 시상식일 뿐이다. 다만 20년 넘게 진행돼 왔고, 다른 시상식이 없기에 대표성을 띌 뿐이다. 별개 행사서 대상을 받은 업체에게 지스타 메인스폰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스타 참가를 독려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주최를 맡은 게임협회의 몫이다. 지스타에 참가가 저조한 이유는 달리 말해 게임협회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고, 이 힘을 키우면 된다. 게임협회가 모래알 협회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이냐 묻는다면 '권한을 부여하라'고 말하고 싶다.
지스타 B2C 참가업체를 늘리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이 지스타가 해외 게임쇼만큼 전세계적인 홍보 및 마케팅 효과가 있으면 된다. E3나 차이나조이가 흥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대안은 강제성을 띄게 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가 개입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두 방식으로 나뉜다.
일단 차이나조이는 게임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출판총서와 과학기술부, 국가체육총국 등 중국 당국이 주최다. 과거 우리처럼 눈치 보이는 업체들은 참가할 수 밖에 없고 단시간 외형을 키웠다. 관 주도로의 회귀는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다.
E3는 우리의 게임협회 같은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가 주최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ESA는 북미와 캐나다 게임등급을 매기는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E3 자체가 세계적인 게임마켓 플레이스로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힘이 있는 ESA가 주최하는 만큼 회원사들은 가급적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게임협회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 등급분류 역시 무늬만 민간이양 상태고 정부 규제안 하나에 산업이 휘청거린다. 자율규제를 내세우며 맡겨달라 하고 있다만, 여전히 정부 시각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처럼 못미더운 눈치다.
향후 지스타를 세계적인 게임쇼로 키우기 위해서는 ESA처럼 게임협회 중심으로 더 많은 권한과 자금이 모여야만 한다. 온라인게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고 모바일게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부회장사는 5년 전의 절반으로 줄었다. 모바일 협회도 생겨나서 게임협회가 온전히 한국게임산업을 대표한다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업체들이 정부 규제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게임협회가 모바일게임사들의 이익을 재대로 대변하지 못한 점 부정하지 않는다. 협회도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공감한다.
하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든 회원사에 공정한 협회를 만들고 그제서야 권한을 부여하고 자본을 수혈하려고 하면 늦다. 지스타는 매년 열리는데 조금씩이라도 협회가 바로 설 수 있게 지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협회만 힘이 있다면 지스타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규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럴수록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