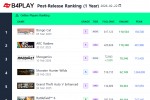때맞춰 정부와 기업도 1인 개발자를 돕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지원책을 발표했고 기업은 심의업무를 대행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료를 낮추면서 화답했다. 오픈마켓은 가난한 인디 개발자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보였다.
서른명 이상이 1년 넘게 개발한 게임을 소수의 개발자가 아이디어만으로 이기기엔 이미 벽이 생겨버렸다. 초기 오픈마켓에서 대박을 친 개발자들조차 많은 지원을 약속한 업체로 자리를 옮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돈을 쫓아 움직이는 것을 비난할 순 없다. 산업이 발전하면 나타나는 당연한 수순이다. 든든한 자본의 지원을 받은 게임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업체들이 눈높이가 올라간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대작 위주의 게임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간다.
오픈마켓에서 자본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아질수록 사람 보다는 돈이 주목 받게 될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는 드라마틱한 인생역전의 이야기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보다는 ‘얼마나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만약 성립된다면 국내서는 ‘앵그리버드’의 신화는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자본 앞에 1인 개발자들의 도전의식이 꺾이지 않기를 빌며 그들의 성공사례를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