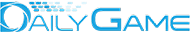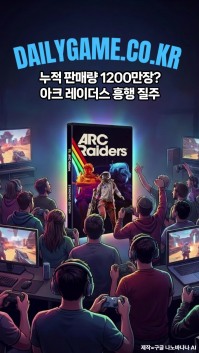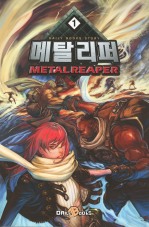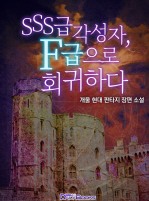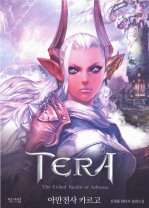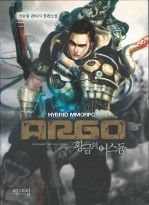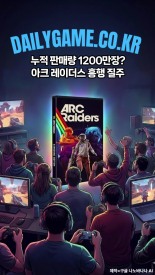이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자사 브랜드에 해가 될 수 있는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결제 처리업체와 금융 중개기관 등을 통해 압박을 했던 것이다. 밸브와 이치오는 이에 따라 게임 노출을 줄이거나 결제를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통 플랫폼과 결제사의 판단에 따라 어떤 콘텐츠는 판매가 가능하고, 어떤 콘텐츠는 유통조차 되지 못한다.
법적 판결이나 공공 심의도 아닌, 상업적 판단이라는 이름 아래 표현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향은 게임을 넘어 웹툰, 소설,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서도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통해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를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비교적 눈에 덜 띄었을 뿐, 앞서 삭제됐던 게임들 중 일부는 국내서도 등급 심의를 거쳐 판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의 한 게임 플랫폼의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GTA' 시리즈나 '듀크 뉴켐', '세인츠 로우'와 같이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성인 게임도 잠재적으로 삭제될 수 있다"고 폭로했던 것을 본다면 위기는 주류 콘텐츠라고 예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지 특정 장르나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되고, 창작자는 점점 더 자기검열에 익숙해지고 있다. 특정 게임이 사라지는 일은 곧 그 게임을 만든 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일이며, 이는 소비자 또한 콘텐츠를 접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검열은 더 이상 국가만의 권한이 아니다. 상업적 판단, 브랜드 이미지, 사용자 불쾌감이라는 명분 아래 조용히 이뤄지는 플랫폼 기반의 사적 검열은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시대의 검열 형태다. 플랫폼이 결제창을 닫고, 유통사가 노출을 줄이며, 정부가 애매한 기준을 묵인하는 사이, 표현의 자유는 조용히 무너진다.
이제는 창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언론, 정책 결정자 모두가 이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콘텐츠가 사라지는 순간은 대개 소리 없이 다가온다. 우리 모두가 방심할 때, 표현의 자유가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