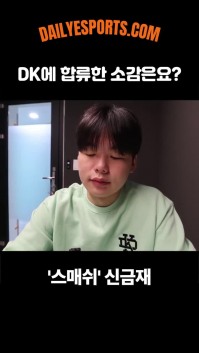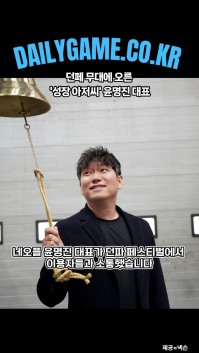2년 만에 부활한 E3가 2일(현지시간) 미국 LA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지만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2년만에 다시 열리긴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 게임전시회의 위상을 회복할지도 미지수인데다 미일 콘솔 게임 잔치로 기획된 탓이다.
국내 업체들은 E3를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활발하게 참여해 왔으나 전시회 성격이 관람객 중심에서 미디어와 관계자 중심으로 바뀐 2007년 부터 참석을 하지 않았다. 올해 전시회는 다시 예전 성격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2009년 전시 프로모션 사업일정이 마무리된 터라 대다수 업체들이 E3를 외면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구 게임산업진흥원)과 지스타조직위는 중소 업체들의 게임 수출을 돕기 위해 E3에 한국공동관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 부스를 내지 않았다. 2003년 이후 매년 E3에 참가해 온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사정도 마찬가지.
국내 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E3가 부활했다고는 하나 예전과 같은 명성을 찾을지도 의문"이라며 "국내 업체들도 예전과 다르게 해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굳이 미국까지 가서 바이어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산업을 이끌던 국내 업체들이 대거 전시회에 불참함에 따라 E3에서 온라인 게임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A 등 일부 콘솔 업체들이 온라인게임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시장이 콘솔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의 불참으로 세계 최대 게임전시회를 표방한 E3는 온라인게임이 없는 반쪽짜리 전시회로 치뤄지게 됐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