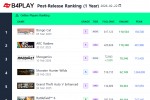[[img1 ]]"국제게임쇼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차이나조이, 한국게임 위상 여전", "차이나조이? 걸조이"
지난 28일부터 중국 최대 게임쇼 차이나조이가 끝난 이후 나온 몇몇 반응들이다. 실제로 그럴까. 기자는 지난 2009년에 차이나조이를 방문하고 불과 2년만에 다시 차이나조이를 찾았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차이나조이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다.
B2C관의 넘쳐나는 소음과 쓰레기, 부스걸을 보기 위한 인파 때문에 불편한 전시장 이동 등은 B2B관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이번에 처음 생긴 B2B관이라 해외업체들의 출전이 많지 않았겠지만 내년에는 훨씬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B2B관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한 것은 비단 B2B관만이 아니다. 2년전 B2C관에서는 중국게임보다 한국게임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한국게임을 만났다. 게다가 한국 게임들은 대부분 전시 부스 메인을 꿰찼다.
차이나조이에 출장오는 기자들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던 '산자이', 일명 짝퉁게임을 찾는 과제도 이제는 없애야 할 것 같다. 올해 차이나조이에서 짝퉁게임이라고 부를만한 게임은 찾지 못했다. 닌텐도 위와 비슷한 컨트롤러를 보긴 했지만 적어도 온라인게임에서 '짝퉁게임'이라 부를만한 게임은 없었다. 과거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짝퉁게임이 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발전이다.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앞서 언급한 엄청난 소음과 더위, 쓰레기, 부스걸등은 바뀌지 않았다. 취재를 온 해외 미디어들을 위한 배려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디어 등록을 하는 곳에 영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단 한명 뿐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이같은 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들이다. 더위야 상하이 날씨가 워낙 정평이 나있고 부스걸이 많은 것은 그들의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음 문제는 지스타에서도 매번 나오고 E3나 TGS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언어 문제 역시 E3야 개최되는 나라가 미국이라 영어가 잘 통해서 그렇지 TGS에서 일본어 모르면 힘든건 매한가지다.
국내 업체들이나 미디어도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할때다. 중국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철저히 경쟁상대로 바라봐야 한다. 미국이 게임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내수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13억명이라는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강력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 소감이 혹시라도 내년에 '지스타보다 나은 전시회'로 내후년에는 '역시 차이나조이는 꼭 와봐야 하는 전시회'로 바뀔까 겁난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