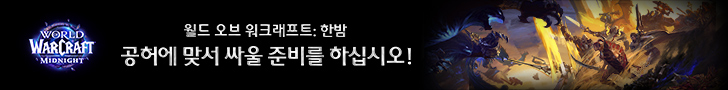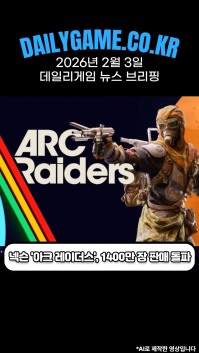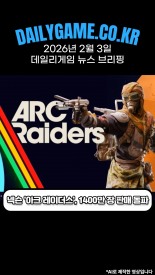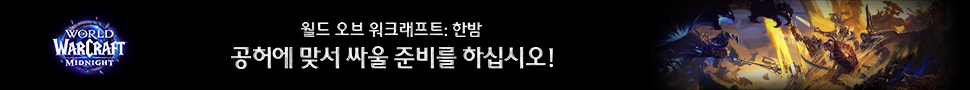소위 '게임밥' 좀 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내용이었다. 게임으로 병을 이겨내고 인간의 뇌 지도를 완성하며,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게임업계가 주장해 온 내용이다. 다만 그것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입증이 되고, 게임을 활용한 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낸 것, 더군다나 게임 때려잡기에 힘 써온 공중파가 '게임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신선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불편했던 것은 게임의 순기능을 알리는 역할에 정작 한국의 큰 회사들이 일조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용 게임을 만든 이수인 대표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만든 중소기업들은 사실 게임사업으로 큰 이득을 본 이들이 아니다. 소아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리미션' 역시 국내 게임업체들과는 무관하다.
그 뿐이냐, 모바일 게임을 통해 나무심기 학교대항전을 펼친 것도, 안전운전 네비게이션을 만든 것도 우리가 알법한 게임회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엔씨소프트 문화재단이 펼치는 일은 의미가 크다. 엔씨문화재단은 저세계 기아퇴치와 지적장애인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프리라이스'는 영단어나 문법, 사회지리, 예술 등 상식을 익히면서 자동으로 쌀을 기부할 수 있고, 'My First AAC'는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게임을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엔씨 치고는 이들 프로그램의 게임성은 다소 조악하다. 교육과 재미, 기능성과 게임성은 양립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만, 이러한 게임을 만드는데 있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는 되묻고 싶다.
큰 회사들이 공적 기능이 강화된,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 한다면 굳이 미국이나 일본의 선한 게임 사례를 들면서 대중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게임회사가 잘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할 때, 분명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걷히고 게임 종사자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