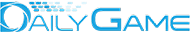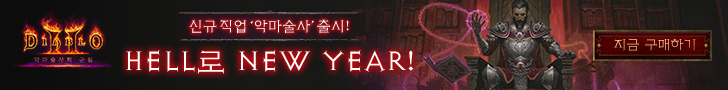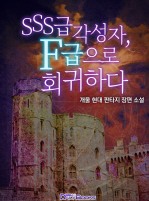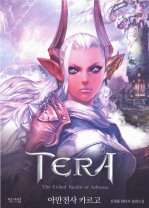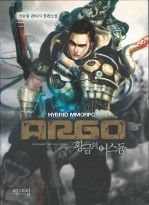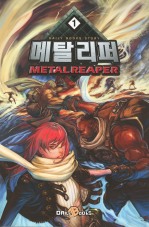대략적인 내용도 나왔다. 이 중 규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생성형 AI에는 워터마크와 표시 의무를 두되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고성능 AI의 안전성 기준도 시대와 기술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고시 권한을 남겨 두었다. 진흥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산업의 활력을 살리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등급분류, 아케이드 시설물, 지식재산권 등 너무 많은 사안을 한 법률에 묶어놓다 보니 본래 취지인 산업 육성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특히 모바일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한 지금의 게임 산업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도 관련 개정안은 지지부진하다. 반대로 산업에 족쇄를 다는 각종 규제는 빠르게 처리되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게임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산업인 만큼, 청소년 보호나 사행성 방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진흥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놓인 규제적 장치들은 산업 전체를 관리의 틀 속에 가두는 효과를 낳고 있다. 진흥과 규제는 구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규제는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진흥법은 육성과 지원에 집중하는 편이 타당하다.
AI 기본법은 이제 막 시행령 초안을 내놓은 단계지만, 그 방향성만으로도 기본법이 지녀야 할 성격을 잘 보여준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정하면서, 안전과 기본권을 보완 장치로 두는 균형이다. 같은 '진흥법'임에도 게임법에서 이런 기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AI 기본법을 보니, 게임법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졌다. 한국 게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어가려면, 산업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법적 틀이 필요하다. 진흥은 진흥답게, 규제는 규제답게 다루는 구조적 전환 없이는, 게임산업은 계속 규제의 울타리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