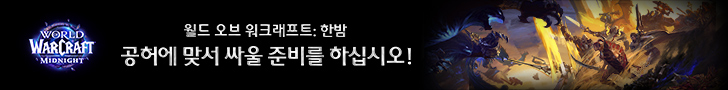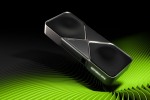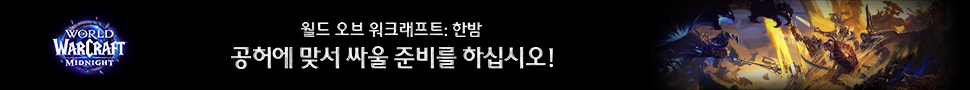블빠는 사실 비속어다. 순화하면 블리자드 게임 마니아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블리자드 게임에 광적으로 빠져있는 이들을 비하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빠를 자청하는 이들이 많다. 블리자드가 만든 게임을 신뢰한다는 게 이유다.
콘텐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내 게임들 다수가 블리자드 게임과 견주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따로 있다. 국내 업체는 마니아층을 넗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블리자다는 매년 블리즈컨이나 인비테이셔널과 같은 유저 행사를 통해 마니아층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 신작 출시를 하루 앞두고 실시하는 전야제 행사 역시 이들의 전매특허다.
콘텐츠 업데이트나 이벤트도 블리자드는 다르게 진행한다. 국내 게임사들이 주간, 월간 단위로 업데이트나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반해, 블리자드는 일년에 한 두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갖는다. 이벤트도 마찬가지다. 출시 1~2주년을 기념해 아이템 드랍율을 상향하거나, 경험치 혜택 등의 이벤트를 연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업체가 너무 퍼주기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온라인게임과 패키지게임이라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잦은 업데이트와 패치는 유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매일 게임을 하지 못하는 유저들은 뒤쳐지기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 입장에서 '빠'는 필요한 존재다. 이들이 생겨나야 더욱 완성도 높은 게임도 만들수 있고, 이용자간 소통도 원활해진다. 그러려면 서비스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블빠처럼 국내에서도 '넥빠', '엔빠', 'N빠' 등이 생겨나길 기대해본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