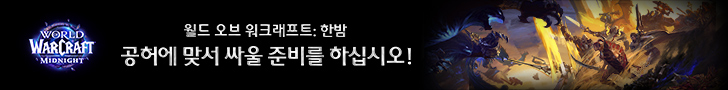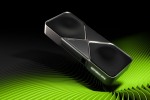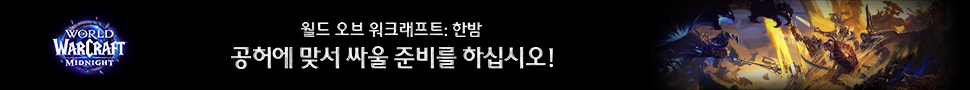2012년 6월, 넥슨재팬이 김택진 대표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 그 자체가 큰 이슈였고, 앞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 한국을 대표하고 온라인게임의 선두주자인 두 회사는 '글로벌'이란 공통된 목표로 힘을 합쳤다. 한쪽은 거금을 들였고, 다른쪽은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최대주주 자리를 내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뒤늦게 그 회사가 EA였고, 창업자 출신 이사의 반대로 M&A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진 대표가 EA 대표를 맡고 김정주 대표가 엔씨 경영권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어쨌던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이 도전은 결실을 맺지 못했고 두 김 창업자는 한동안 실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지스타 이후 두 회사는 제대로 된 협업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보면, 합병의 목적 자체가 EA 인수였을 것이다. 8000억대 '빅딜'을 한 두 회사치고는 이후 자세가 너무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인 리더십 중심의 엔씨와 조화 중심의 넥슨 기업문화가 달라 섞이기가 힘들다는 얘기들도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큰 거래 이후 두 회사가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글로벌'이란 화두 앞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설령 최우선 목표가 실패하더라도 다음 목표를 설정해뒀으면 어땠을까. 서로의 DNA를 뒤섞어 장점을 흡수하거나, 양측이 보유한 IP를 각자가 잘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만드는 것 말이다. 글로벌 목표가 사라지니 이 좁은 국내서 다시 경쟁자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무심할 정도로 아무 일이 없이 갈라섰다.
누구나 알듯이 두 회사는 정통 MMORPG와 캐주얼 게임의 강자다. 서로가 잘 알고 있었고, 2005년을 기점으로 서로의 영역에 도전장을 냈다. 엔씨는 캐주얼포털 '플레이엔씨'에 '스매쉬스타', '엑스틸' 등 캐주얼게임을 붙였고, 넥슨은 정통 MMORPG '제라'로 맞불을 지폈다. 결과는 두 회사 모두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겼다. 두 회사의 협업은 이러한 실패를 줄이는 초석이 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김택진, 김정주 대표가 뜻을 같이 했던 '한국 게임 위기론'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외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모바일게임도 한국은 후발주자다. 수출은커녕 안방시장까지 내줬다. 두 회사는 엔저 덕분에 서로 큰 피해 없이 헤어졌다 안도할 수 있겠다만, 이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은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난다.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두 회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