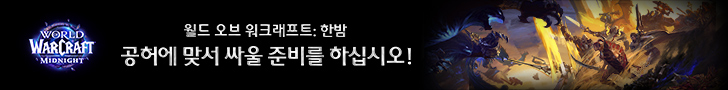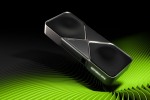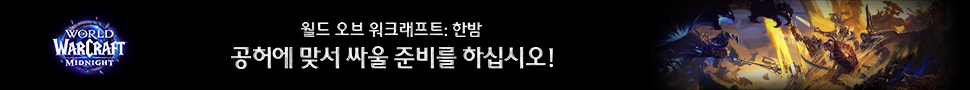김택진 대표는 '블레이드앤소울'이 게임대상을 수상한 2012년 지스타에서 '2013년은 엔씨 모바일 원년'이라 선언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 국내는 건너뛰고 중국서 출시한 '블소모바일'이 직접 개발한 유일한 게임이고, 나머지 3종은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가 내놓은 게 전부다. 텐센트로부터 코치를 받은 '블소모바일'은 초반 기세가 꺾였고 엔트리브표 게임들은 국내 안착에 실패했다.
그때처럼 이번도 단순 퍼블리싱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엔씨는 모바일게임을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시장을 노려왔다. 단순 테스트 차원에서 중국산 모바일게임을 수입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주류로 성장한 모바일게임시장과 당시 웹게임 시장을 동일선에 두고 판단한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물론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 중국게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게임이라면 한 수 아래 깔고 봤던 일도 옛말이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더 배울 것이 많다.
김택진 대표는 '리니지'로 국내시장을 평정했지만, 2000년대 초반 E3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고 했다. 그때의 설움과 성공에 대한 갈망은 글로벌 시장에 자신과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됐지만 리차드 게리엇은 북미와 유럽시장에 엔씨라는 회사를 알렸고, 그가 다리를 놓은 아레나넷은 엔씨가 북미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됐다.
그러나 이번 중국 모바일게임 퍼블리싱은 그때와 같은 '절치부심'에서 나온 결정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2000년 대 중반 플레이엔씨로 캐주얼 시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인가, 급변하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엔씨는 신중해도 너무나 신중하다. 얼마나 대작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엔씨라는 이름값에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홈런타자는 그만큼 삼진도 많이 당한다. 타율이 3할이면 충분하다. 국내 모바일게임 1등 넷마블도 수없이 많은 게임을 내놓고 실패를 했다. 그 중 성공한 게임들이 오늘의 넷마블을 만들었다. 변수가 많은 모바일 시장은 성공잣대가 내부 허들과 다를 수 있다.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해 만들다가 엎고 다시 시작하기 보단, 일단 시장의 평가를 받아 보는 게 어떨까. 모바일게임에 있어 엔씨를 보노라면, 완벽히 홈런을 칠 때까지 대타만 내보내는 10할 대 타자가 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또 걱정된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