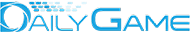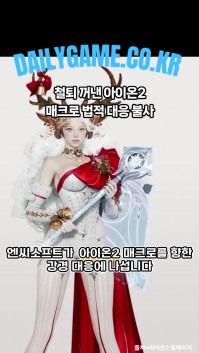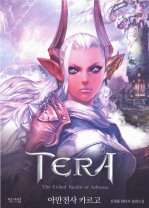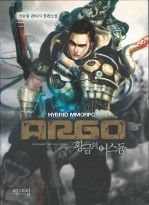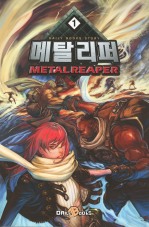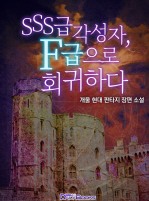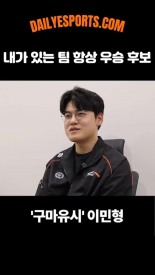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게임 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에서 전성민 교수는 먼저 1984년 대법원이 '성냥개비 고스톱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소개했다.
이 '성냥개비 고스톱 사건'은 피고인 네 명이 각각 1000원을 내고 성냥개비 10개씩을 나눠가진 뒤 특정 점수에 성냥개비를 1~3개씩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했던 것이 도박죄에 해당하느냐를 물었던 사건이다.
이어 "게임 산업에서 가장 이슈로 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미성년자 결제', '게임 내 불공정성',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경우 전체 온라인 서비스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인 '약관의 불공정성'이나 '노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데이터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연결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게임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가장 먼저 정착된 분야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체계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정부 주도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 위탁 방식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그리고 민간 중심의 게임정책자율기구라는 삼중 구조의 기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접근하고 있다고 그 구조를 소개했다.
예컨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임 단속과 등급 분류 등 규제 중심의 기능을,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피해 구제와 상담, 인증 등 민원 중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 고도화를 목표로 협회와 학계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 운영 체계로 구성돼, 게임 산업 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복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갖춰지면서 이용자 보호의 방향성 역시 기존에는 '온정주의'에 가까운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이용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참여형 보호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전성민 교수는 이를 ‘방패에서 메가폰으로의 전환'으로 비유했다.
다만 결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 중 미성년자 결제 문제의 경우 “10대를 주요 타겟으로 한 게임에서 실 사용자 결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실제 결제는 40대가 많았다”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건네 결제를 허용하거나 방치한 결과로, 단순한 제도 미비보다 가정 내 관리 부재와 사회문화적 관행의 영향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운영자의 게임 내 개입 여부'도 뜨거운 이슈라며 "운영자가 직접 개입해 불공정한 결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측과 게임 내 질서와 커뮤니티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는 운영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를 넘어, 법적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성민 교수는 "게임 이용자 보호는 이제 더 이상 ‘취약 계층 보호’만의 문제제가 아닌 정보 비대칭, 알고리즘 불투명성, 소비자 권익 침해 같은 이슈는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공통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게임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소비자의 권리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게임은 사회적으로도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는 방패가 아닌 메가폰을 쥔 이용자들이 게임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