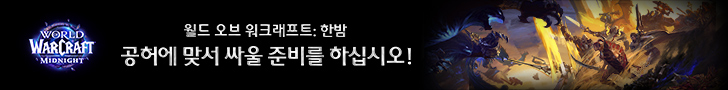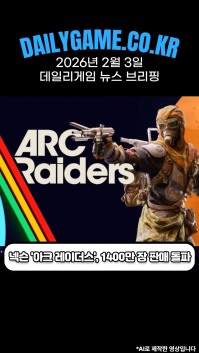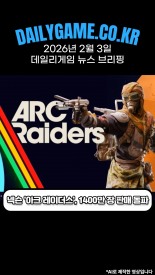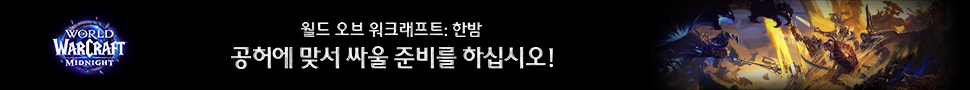그간 K-게임은 압도적인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책 금융 시장에서는 늘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해왔다. 이번에야말로 독립된 법적 울타리를 세워 전문 심사역을 확보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했던 산업계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 다시금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뒤로 밀려난 셈이다.
이 중 게임은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되며 '문화기술(CT) 펀드' 항목에 이름을 올렸으며, 성장 가능성이 큰 신성장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신성장 펀드' 쪽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 818억 원 규모의 독자적인 자펀드 결성을 추진하는 영화 부문에 비하면,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예산이라는 화려한 수치 뒤에 가려진 '게임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하지만 정책의 행간을 뜯어보면 이번 발표가 단순한 '홀대'라기보다는,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을 콘텐츠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고민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기술 중심'의 공격적 행보가 글로벌 트렌드나 현장의 실상과는 여전히 괴리돼 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현재 글로벌 경쟁국들은 금융 논리 이전에 파격적인 '비용 보전'으로 자국 기업을 지키고 있다. 캐나다가 개발자 임금의 최대 40%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며 인적 자산 유출을 막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이 제작비의 30% 내외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며 기업의 도산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 국가들이 게임의 특수성을 인정해 제작사의 경영권을 지켜주며 생존 토양을 다질 때, 우리 정부는 전용 계정조차 없이 '수익률'을 따지는 펀드라는 시험대 위에 게임사들을 줄 세우고 있다.
실제로 게임은 흥행 불확실성이 크지만 성공 시의 폭발력이 강한 장르적 특수성을 지닌다. 투자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용 펀드 구조 내에서는 전문 심사역의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대형 IP나 일반 IT 솔루션 업체에 투자가 쏠리는 '양극화'가 필연적이다.
당장 인건비 가뭄에 시달리며 해외 자본의 유혹을 받는 중견·중소 개발사들에게 '기술 리더십'은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화려한 기술 지원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산업의 허리인 제작 현장의 고정비 부담과 전문적 보호망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인적 인프라는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이 K-게임의 재도약을 위한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쉬움 뒤에 숨은 실익을 기민하게 챙기는 '운용의 묘'가 절실하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투자가 아니라, 가뭄에 마른 땅을 적셔 다시 물이 솟구치게 하는 마중물처럼, 이번 자금이 중소 개발사의 데스밸리를 넘기고 기술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