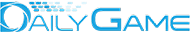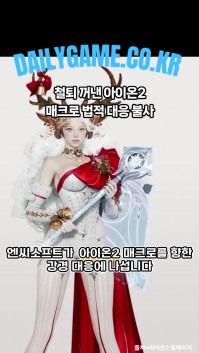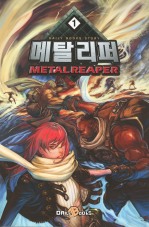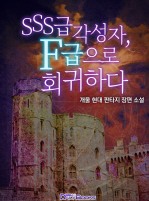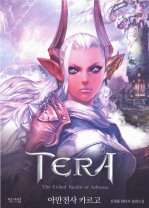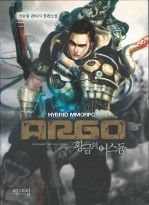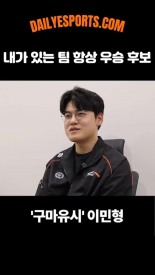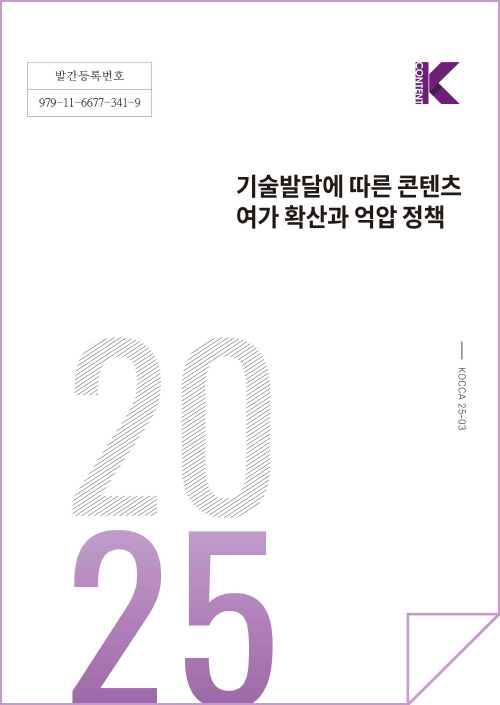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디그라한국학회가 수행한 '기술발달에 따른 콘텐츠 여가 확산과 억압 정책' 보고서는 게임이용장애 논란이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주변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병리로 축소시키는 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를 기점으로 게임 규제가 '청소년 보호'에서 '중독 물질 관리'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을 즐기는 행위는 병리적 문제로 규정됐고, 진단과 치료를 통한 관리 대상으로 의료화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의료화가 사회 구조적 요인을 가린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과도한 학업·업무 환경이나 경제적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은 외면된 채, 문제의 원인이 게임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게임 이용자는 잠재적 환자나 범죄자로 낙인찍히며, 게임이 주는 즐거움의 본질적 가치가 경시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즐거움'을 억압의 대상이 아닌 복지의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즐거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보장·진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도파민 덩어리'나 '유해 매체'로 낙인찍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즐거움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