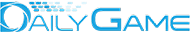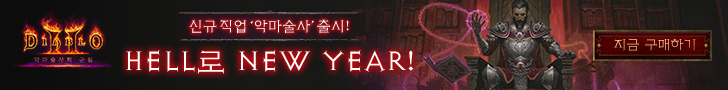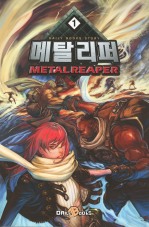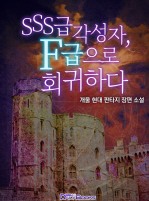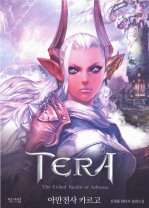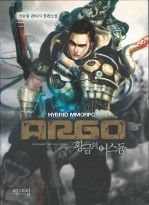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글=신진섭 게임칼럼니스트]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게임 업계에 여성 작가 배제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일부 성우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사실상 퇴출됐으며 기업들에게는 이를 바로잡아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권위의 발표만 보면 한국 게임판이 여성을 혐오하는 몰염치하고 미성숙한 집단처럼 느껴집니다. 페미니즘은 선, 게임업계와 이용자는 사회적 정의를 탄압하는 악당(빌런)같죠. 선과 악의 이분법이라면 편리하겠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와 가치평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이념이 아닌 생존의 투쟁, 즉 '먹고사니즘'의 문제입니다.
![[겜문학개론] 한국 게임판은 여성을 혐오하는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90117172404759da2c546b3a21924821994.jpg&nmt=26)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성우가 남성 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며 게임 불매운동을 전개했고, 결국 게임사는 다른 성우를 고용해 캐릭터 목소리를 덮어씌웁니다. 프리랜서였기에 일각에서 주장했던 '해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녹음을 한 금전적인 대가도 지불했습니다.

이후 4년간 비슷한 논란이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래디컬 패미니스트임을 인증하는(또는 그런 기미가 있는) 성우 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게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에 반발하는 이용자들이 커뮤니티와 공식 카페에 몰려가 게임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논란은 성난 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즉 문제의 창작자들을 게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잠재웠습니다.

페미니즘 지지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은 래디컬 페미니즘의 내포하고 있는 '남성혐오'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우위인 한국에서 '남성혐오'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죠. 이념전쟁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타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온도차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제 1목적은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생존과 수익추구입니다. 이념과 정의는 상대적이지만 매출은 절대적인 까닭입니다.

이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자신의 작품을 말하기 어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게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게 금기시 됐습니다. 이념성을 내비치는 성우들은 좀처럼 게임 내에 출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정 이념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소비층 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슈일지라도 게임사는 이를 막으려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영상의 '리스크 헤지' 기법인거죠.
사상의 다양성 좋죠. 업계에서도 논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래'라는 먹고사니즘앞에 이념은 무력했습니다.
◆남초문화 개선, 말만으로는 해결 안된다

인권위가 지적했듯 게임업계는 남초산업입니다.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남성 중심적이죠. 혹자는 여성들도 요즘엔 게임을 많이 한다고 반박하겠지만 이는 장르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주요 매출원인 MMMOPRG(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나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의 이용자층은 남성층이 절대다수입니다. 돈을 좇는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인권위의 권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남성성 위주의 게임문화를 전복하고 싶다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성 게임 소비자들이 힘을 얻으려면 여성향 게임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성이 돈이 된다면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도 변화할 겁니다. 여성향 게임 전문 업체나 개발진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종사자수도 자연스레 늘수 있죠. 영화나 웹툰, 웹소설, 출판 등 타 대중문화에선 이미 현실화된 얘기입니다. 논란 속에서도 영화 '82년 김지영'이 370만 명을 모았고, 여성이 주인공인 공감툰이 쏟아져 나옵니다. 디즈니의 캐릭터들이 왕자의 선택을 기다리던 공주에서 왕자를 간택하는 주도적인 여성으로 변신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게임 콘텐츠를 반여성적, 반가족적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인권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제작 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친여성을 표방하는 몇 개의 인디게임은 탄생하겠지만 주류문화를 전복하기에는 미약해 보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 듣기 좋은 소리지만 공허하기 그지없는 말잔치처럼 들립니다. 억지로 하라고 등을 떠민다고 여성친화적인 게임 생태계가 조성될까요. 문제적 인물들의 복귀로 매출이 빠진다면 인권위가 벌충해주나요. 한국 게임판은 여성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파산과 부도, 주가 하락을 혐오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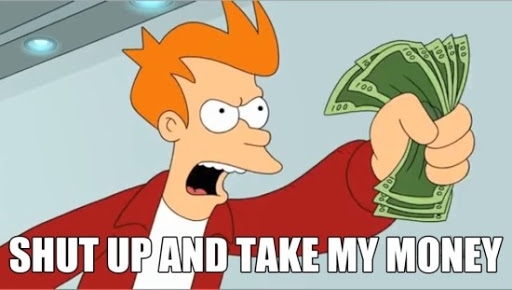
정리=이원희 기자(cleanrap@dailygame.co.kr)